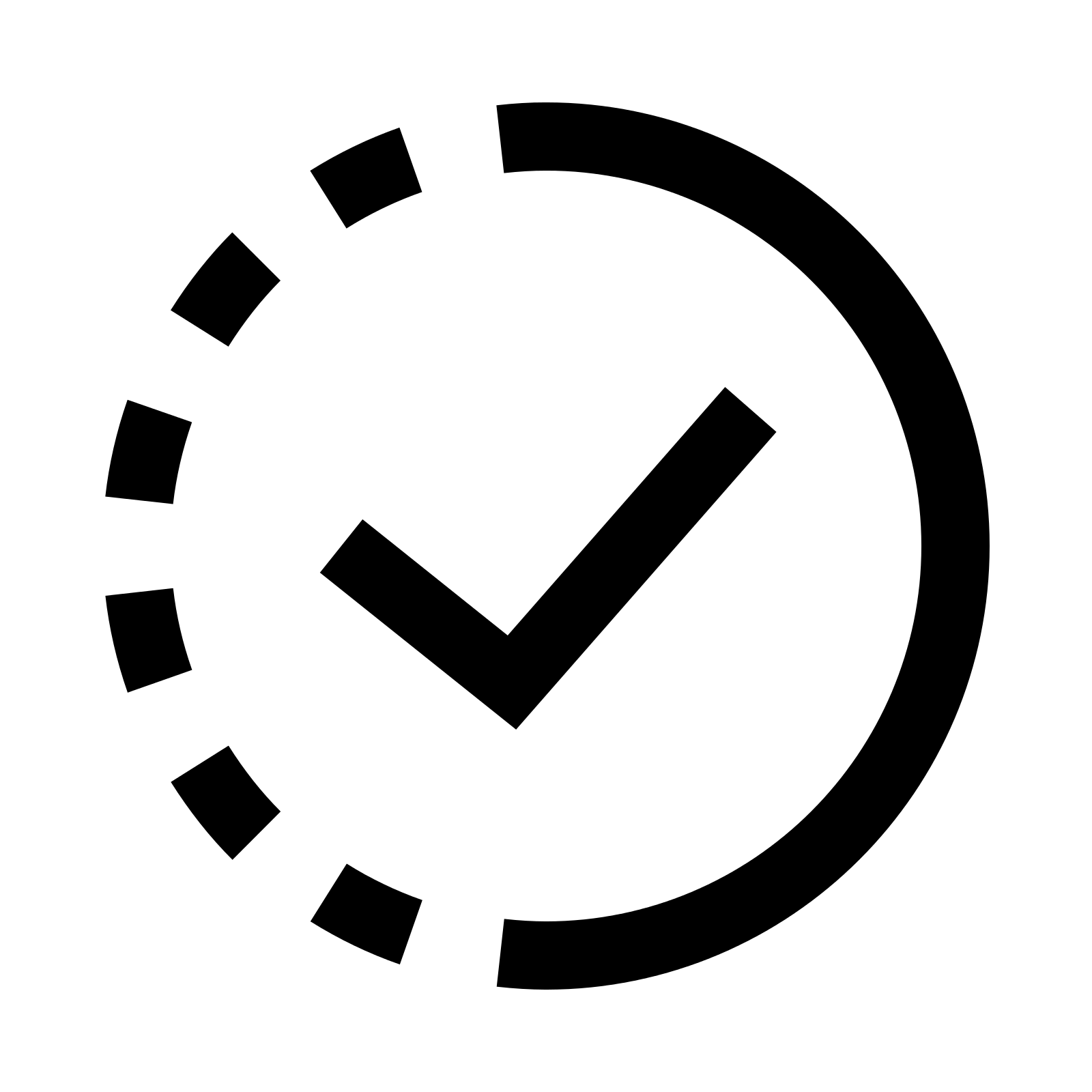세신
by Lee Ho Sung
아이들 방학을 맞아 부산 처가에 다녀왔다. 처가 근처에는 허심청이라는 목욕탕이 있다. 온천동(행정 지역명)에 있는 만큼 규모가 큰 목욕탕이다. 명절에 처가에 내려가면 아들 녀석과 종종 들리곤 했었는데, 코로나로 한참을 가지 못했다. 아들 녀석은 부산에 갈 때 마다 큰 목욕탕 이야기를 했었다. 허심청에는 족욕을 하면서 장기를 둘 수 있는 곳이 있는데 그곳에서 아빠와 발가벗고 알까기를 했던 것이 깊게 인상에 남았나 보다. 흠.
코로나가 우리 가족을 지나가기도 해서 이번에는 허심청에 가봤다. 2년 전 아들은 목욕탕에서 나를 졸졸 따라다니더니, 이제는 좀 컸는지 열탕에 몸을 지지고 있는 나를 내버려 두고 자기가 가고 싶은 곳을 돌아다닌다. 나도 미니풀장에 아들을 두고, 사우나에 들어갔다. 사우나에 들어가 괜히 먼저 들어간 사람과 모래시계의 눈치를 봤다. 먼저 들어간 사람이 나가자 10을 세고 밖으로 나왔다. 찬물에 몸을 한번 담갔다가 아들을 찾아갔다. 멀리서 봐도 신나게 놀고 있다. 잘 놀고 있냐고 물어봤더니, 미니 풀장에서 바구니 두 개를 겹쳐서 수영으로 왔다 갔다 하고 있단다. 수영 학원을 보낸 보람이 있다. 다시 사우나로 향했다.
미니풀장과 사우나 사이에는 세신 코너가 있다. 안 그래도 왔다 갔다 하면서 세신 메뉴판과 탕에서 때를 불리기 위해 몸을 담그고 있는 사람들을 힐끗힐끗 보았는데 충동적으로 아저씨에게 말을 걸고 말았다.
“자리 있습니까?”
“네. 비 있습니다. 누우 이소.”
아저씨는 안쪽 침대를 가리켰고, 나는 자리에 누웠고, 아저씨는 발목에 있는 키를 빼셨다. 이제 돌이킬 수 없다. 두근두근. 목욕을 그리 자주 하진 않지만 그래도 어렸을 때부터 지켜보던 “어른의 공간”에 들어간 느낌이다. 왠지 흐뭇하다.
“바로 누이소”
다행히 민망하지 않도록 얼굴을 수건으로 덮어 주셨다. 편안한 마음으로 기다리는데 갑자기 아저씨의 때밀이가 시작되었다. 이것은 세신이라는 고상한 표현이 적합하지 않은 그런 것이었다. 마치 도마 위 생선의 비늘을 벗기는 것 같은 강력한 느낌이었다. 이태리 타올 10개를 한 번에 쓰시는 것이 분명했다. 이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순간 들었지만 “어른의 공간”에 들어온 나는 멈출 수도 아주 작은 신음 소리도 낼 수 없었다.
아저씨는 나를 90도씩 돌려가며 때밀이를 이어가셨다. 온 신경이 아저씨의 손길에 집중되어 미니풀장에서 놀고 있는 아들 녀석은 생각나지도 않았다. 과연 때는 밀리고 있는 걸까. 얼굴이 가려져 있어 확인을 할 수도 없었다. 그저 한 부위가 끝났을 때 뿌려지는 온수만이 작은 안도감을 주었다.
중간중간 구석진 곳의 때를 밀기 위해 이상한 자세를 유도하셨다. 이렇게 360도를 돌고 나니 때밀이가 끝났다. 하지만 얼굴에는 여전히 수건이 덮혀져 있었다. 이번에는 비누칠을 할 시간이었다. 볼 수 없어 확인할 수는 없었지만 세차할 때 쓰는 바로 그 스펀지와 같은 걸레가 분명했다. 순식간에 몸 전체가 거품으로 덮였다. 아. 세차를 할 때 자동차는 이런 기분이겠구나.
거품을 묻힌 채로 어깨와 등의 간단한 안마가 이어졌다. 아마 아저씨는 “이 녀석 왜 이렇게 몸이 굳어 있어?” 싶으셨을 거다. 나는 앞 과정의 놀람으로 다음에 뭐가 이어질지 몰라 계속 긴장할 수밖에 없었다.
“다 됐십니다.”
다시 목욕탕 키를 건네받았다. 휴우. 끝났구나 싶은 생각과 함께 처음으로 때를 밀어봤다는 처음의 흐뭇함이 다시 살아났다.
미니 풀장으로 돌아왔다. 아들 녀석은 여전히 풍덩풍덩 거리면서 잘 놀고 있었다.
“아빠가 말이야.. 저기 옆에 가서 때를 밀었는데, 어우 진짜 피부가 벗겨지는 줄 알았어. 이제 너도 아빠랑 때 밀러 가자. 아빠가 잘 밀어줄게.”
Subscribe via R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