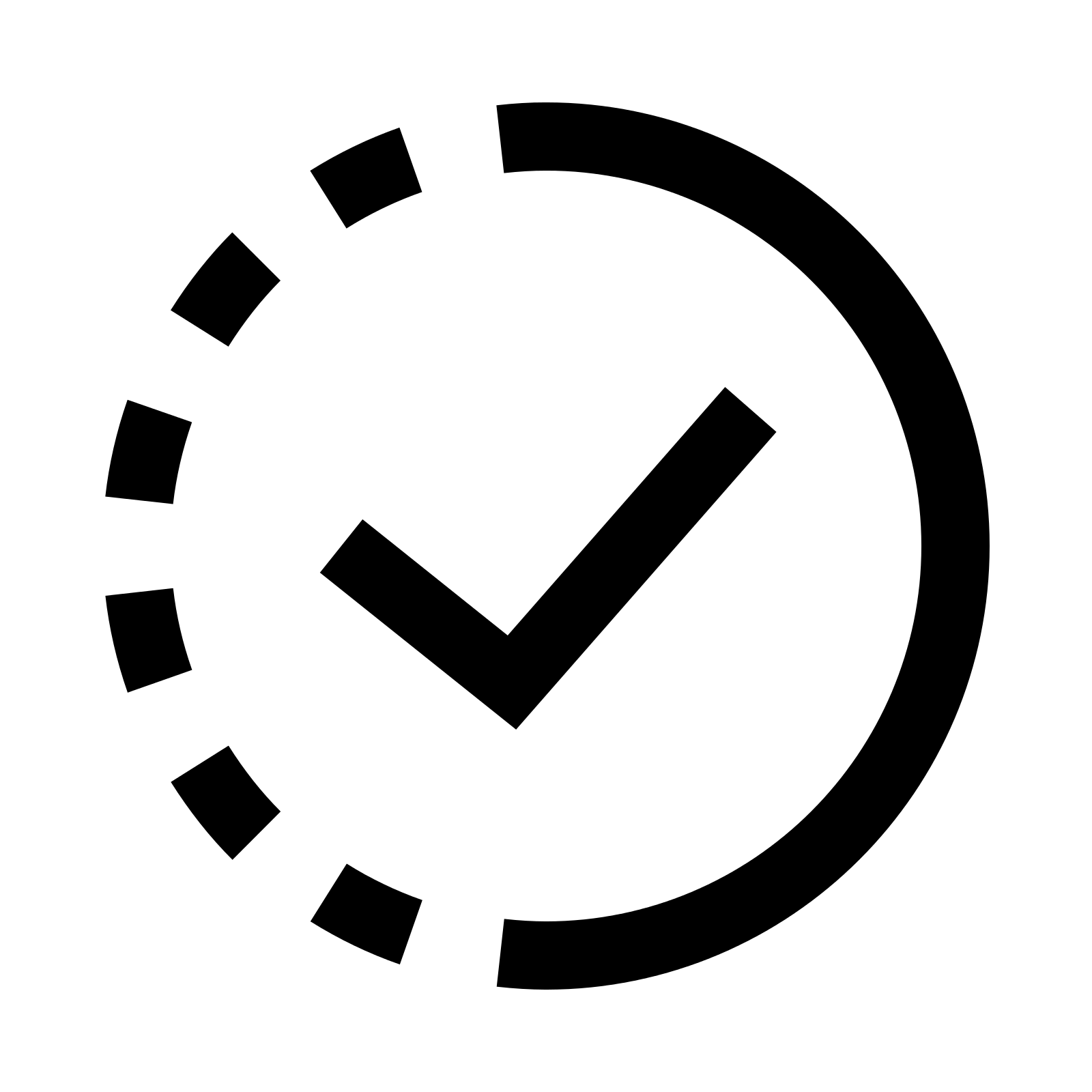좋나?
by Lee Ho Sung

좋나라는 게임이 있다. (발음에 주의하자. 조온나아\ 가 아니라 존나/ 다.) 내가 초등학교 때 경상도 지역에서 하던 야구와 비슷한 놀이다. 찾아보니 공식 명칭은 찜뿌라고 하고, 지역마다 부르는 이름은 다르다. 타자는 테니스 공을 손에 쥐고 수비 측을 향해 외친다. “좋나?” 그러면 수비 측에서는 준비가 되었다는 의미로 “좋다!”라고 외친다. (“좋다!”를 외치지 않은 상태에서 기습적으로 공을 날리면 벤치 클리어링이 발생한다.) 그럼 타자는 주먹으로 공을 멀리 쳐서 보내고 1루로 달리면 된다. 당시에 키도 작고, 주먹도 작았고, 달리기도 느렸던 나는 타자로는 게임을 별로 즐기지 못했다. 그래서 주로 “좋나?” 보다는 “좋다!”를 외쳤던 기억이다.
요즘 달리기를 즐기고 있다. 어쩌다 보니 다음 주말에 첫 번째 하프 마라톤을 앞두고 있다. 그래서 종종 퇴근 후 집까지 뛰어오는 연습을 하고 있다. 회사 스터디까지 마치고 20Km가 넘는 거리를 달려오다 보니 12시가 넘어서 집에 도착한다. 40살 아저씨가 밤 12시가 넘어서 땀에 푹 젖은 운동복에 이상한 러닝 벨트를 하고 헉헉거리며 집에 들어서니, 부산 출신 와이프가 웃으며 물어본다.
“좋나?”
“어. 좋다. ㅎㅎ”
20년 동안 학습된 와이프 기분 모델로 와이프의 웃음을 분석해 보건대 한심 20%, 응원 30%, 옛다 관심 50% 다.
어제 밤늦게 까지 써서 브런치에 올린 글을 하루 만에 1,000명이 넘게 읽었다. 오늘 내내 “클클클..” 하면서 통계 페이지를 들락거렸다. 아이들이 잠들고 나서 식탁에 앉아 대출이자 이야기를 하다가 통계 페이지를 와이프에게 보여주면서 자랑을 했다. 와이프가 물어본다.
“좋나?”
“어. 좋다. ㅎㅎ”
둘째가 학교를 가기 시작하면서 아이들이 외부에서 보내는 시간이 늘어나고 집에서도 스스로 보내는 시간이 늘어났다. 집안 어른들의 도움을 기대하기가 어려워 빡빡했던 우리 부부의 삶에도 조금씩 각자의 시간이 생겨나는 중이다.
나는 달리기와 글쓰기를 하고, 와이프는 재테크 책을 보며 뭔가 열심히 정리를 한다. 가끔 목이 말라 깼을 때에도 거실에 앉아 집중하고 있는 것을 보면 재미있나 보다. 그러고 보니 나도 “좋나?”라고 물어봐 줄 것 을 그랬다. 그러면 와이프도 분명 “어. 좋다.”라고 답했을 거다.
각자의 회사에서 큰 성취를 이루는 것도 물론 좋겠지만, 그것은 아주 많은 노력과 긴 시간 그리고 무엇보다도 운이 따라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 행복은 삶의 틈에서 작은 즐거움을 찾는 것, 그리고 그것을 이해해주고 서로 관심 가져 주는 사람과 함께 사는 것이다. 앞으로도 각자의 삶에 “좋나?”라고 관심 가져주고, “어. 좋다.”라고 만족감과 관심에 대한 감사함을 표현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렇게 주고받았을 때 우리의 삶이 즐거운 게임이 되지 않겠나.
Subscribe via RSS